자살의 징후와 예방
자살을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다. 자살 징후 파악과 예방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탤런트 최진실씨처럼 유명인이 자살한 뒤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살을 앞둔 사람은 반드시 징후를 보인다. 민성길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는 "죽고 싶다는 말과 낙서, 문자메시지는 가장 흔한 자살 징후"라고 설명했다.
미국 응급의학협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은 갑자기 폭식을 하거나 반대로 먹지 않는 등 식습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살 관련 책, 독극물에 관심이 많아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
민 교수는 "강제 퇴직, 경제적 손실 등으로 힘들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담담해지는 것도 증상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머지 않아 자살을 결행하려는 조짐"이라고 말했다.
징후가 나타나면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은 바로 자살예방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상담전문기관인 생명의 전화가 지난해 펴낸 자살예방 지침서는 '▲절대 혼자 두지 말라 ▲119, 의료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라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선을 마주보면서 손을 잡고 대화하라 ▲자살 기도자의 입장을 이해하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라'고 권장하고 있다.
자살예방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자살 기도자가 처한 상황을 무시하거나, 자극을 주면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자살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두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은 고위험군"이라며 "고위험군 징후를 보이면 자살이 임박했다는 의미이므로 곧바로 지역응급센터나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협회 등 관련 단체에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은철 분당차병원 정신과 외래교수는 "주변에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 누구나 자살 예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자살하는 사람의 80~90%가 술의 힘을 빌려 자살을 시도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우울증 등 자살 징후가 있는 사람들이 술을 자제하도록 주변에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을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다. 자살 징후 파악과 예방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탤런트 최진실씨처럼 유명인이 자살한 뒤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살을 앞둔 사람은 반드시 징후를 보인다. 민성길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는 "죽고 싶다는 말과 낙서, 문자메시지는 가장 흔한 자살 징후"라고 설명했다.
미국 응급의학협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은 갑자기 폭식을 하거나 반대로 먹지 않는 등 식습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살 관련 책, 독극물에 관심이 많아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
민 교수는 "강제 퇴직, 경제적 손실 등으로 힘들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담담해지는 것도 증상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머지 않아 자살을 결행하려는 조짐"이라고 말했다.
징후가 나타나면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은 바로 자살예방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상담전문기관인 생명의 전화가 지난해 펴낸 자살예방 지침서는 '▲절대 혼자 두지 말라 ▲119, 의료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라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선을 마주보면서 손을 잡고 대화하라 ▲자살 기도자의 입장을 이해하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라'고 권장하고 있다.
자살예방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자살 기도자가 처한 상황을 무시하거나, 자극을 주면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자살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두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은 고위험군"이라며 "고위험군 징후를 보이면 자살이 임박했다는 의미이므로 곧바로 지역응급센터나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협회 등 관련 단체에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은철 분당차병원 정신과 외래교수는 "주변에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 누구나 자살 예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자살하는 사람의 80~90%가 술의 힘을 빌려 자살을 시도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우울증 등 자살 징후가 있는 사람들이 술을 자제하도록 주변에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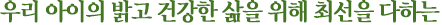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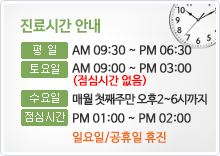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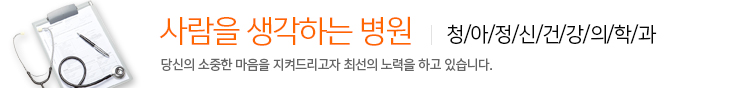





 뮤즈웍스
뮤즈웍스